 강지은
강지은
[한국심리학신문=강지은 ]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난감한 상황에 처하면 손발이 오그라들고, 더 이상 못 보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또한, 슬픈 결말을 맞은 드라마를 본 후 며칠 동안 계속 그 여운에 빠져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흔히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허구의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감정적 과몰입’이라 불린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분명히 허구임을 알면서도, 그 이야기에 이토록 깊이 빠져들고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걸까?

감정적 과몰입의 심리학적 원인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뇌에 존재하는 ‘거울신경망(mirror neuron network)’ 때문이다. 거울신경망은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고, 그 사람의 감정에 반응하는 신경망을 말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상의 인물의 감정에도 무의식적으로 공감하고, 그들의 감정을 마치 우리의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속 주인공이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그 감정을 함께 느끼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울신경망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서스펜션 오브 디스빌리프(Suspension of Disbelief)’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관객이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허구적인 이야기에서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요소들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몰입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19세기 영국의 시인 새뮤얼 테일러 콜리지(Samuel Taylor Coleridge)가 처음 제안했으며, 이후 문학, 연극, 영화 등 다양한 매체에서 연구되고 발전하였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이건 현실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경험이 바로 서스펜션 오브 디스빌리프 덕분이다.
마지막으로 ‘도파민 중독’이 있다.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은 쾌감이나 보상감을 유발하며, 이를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에 계속 몰입하도록 만든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감정적으로 강렬한 장면을 경험하면 뇌는 보상 반응을 보이고, 이에 따라 다시 그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 이렇게 도파민이 뇌에 분비되면 우리는 그 콘텐츠에 더 몰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감정적 과몰입이 심화된다.
감정적 과몰입의 심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감정적 과몰입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될까? 그 원인에는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이다. OTT 서비스의 등장으로 우리는 한 번에 여러 편의 드라마나 영화를 연속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매주 방송되는 드라마를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계속해서 다음 에피소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몰입하게 된다. 이처럼 끊임없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환경은 몰입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스트레스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잊기 위해 콘텐츠 속으로 도피하려 한다.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감정적으로 몰입하면, 현실에서 느끼는 힘든 감정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과몰입은 일시적으로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지만, 지나치게 몰입하면 그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감정적 과몰입을 건강하게 조절하는 방법
‘감정적 과몰입’이 심화되면 현실과 감정이 혼동되거나, 장기적으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몰입에서 벗어나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감정적으로 강한 자극을 받는 콘텐츠를 본 후에는 ‘이건 허구’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는 현실이 아니야”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감정을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다. 또한, 감정적으로 힘든 장면을 본 후에는 심호흡을 하거나 명상, 가벼운 산책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허구의 이야기에서 빠르게 벗어나 현실로 돌아올 수 있다.
두 번째로,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하게 한 콘텐츠에 몰입하기보다는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함께 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건강하게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법이다.
공감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능력이다. 하지만 과도한 감정적 몰입은 자칫 자신에게 해로울 수 있다. ‘감정적 과몰입’을 건강하게 조절하면서, 콘텐츠를 소비할 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과몰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좀 더 평안하고 건강한 감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참고문헌
1) HiDoc, [Website], 2020, 이 상황 더 못 보겠어! ‘공감성 수치’에 대하여
https://news.hi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8
2) 정신의학신문, [Website], 2023, 공감하는 능력, 인간의 전유물일까?
https://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4354
3) 중부일보, [Website], 2024, [OTT 열풍에 웁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시청… 구독료 올라도 못끊는 '도파민 중독’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54763
4) Busselle, R., & Bilandzic, H. “Fictionality and Perceived Realism in Experiencing Stories: A Model of Narrative Comprehension and Engagement.” Communication Theory, 18(2), 255-280.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sychology.or.kr/news/view.php?idx=9778
http://www.psychology.or.kr/news/view.php?idx=9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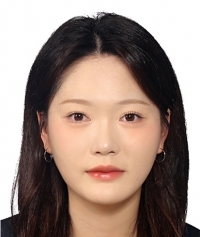
kje0739@naver.com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감정적으로 깊이 몰입하는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거라 생각해요. 저도 감정이입이 심한 편이라 슬픈 장면을 보면 우울하기도 하고, 난감한 상황에서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느낌이 들곤 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뇌의 거울신경망, 서스펜션 오브 디스빌리프 같은 심리적 요인 때문이라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특히 OTT 서비스로 인해 감정적 몰입이 더 심화된다는 부분이 공감됐어요. 앞으로는 허구와 현실을 적절히 구분하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느꼈어요.